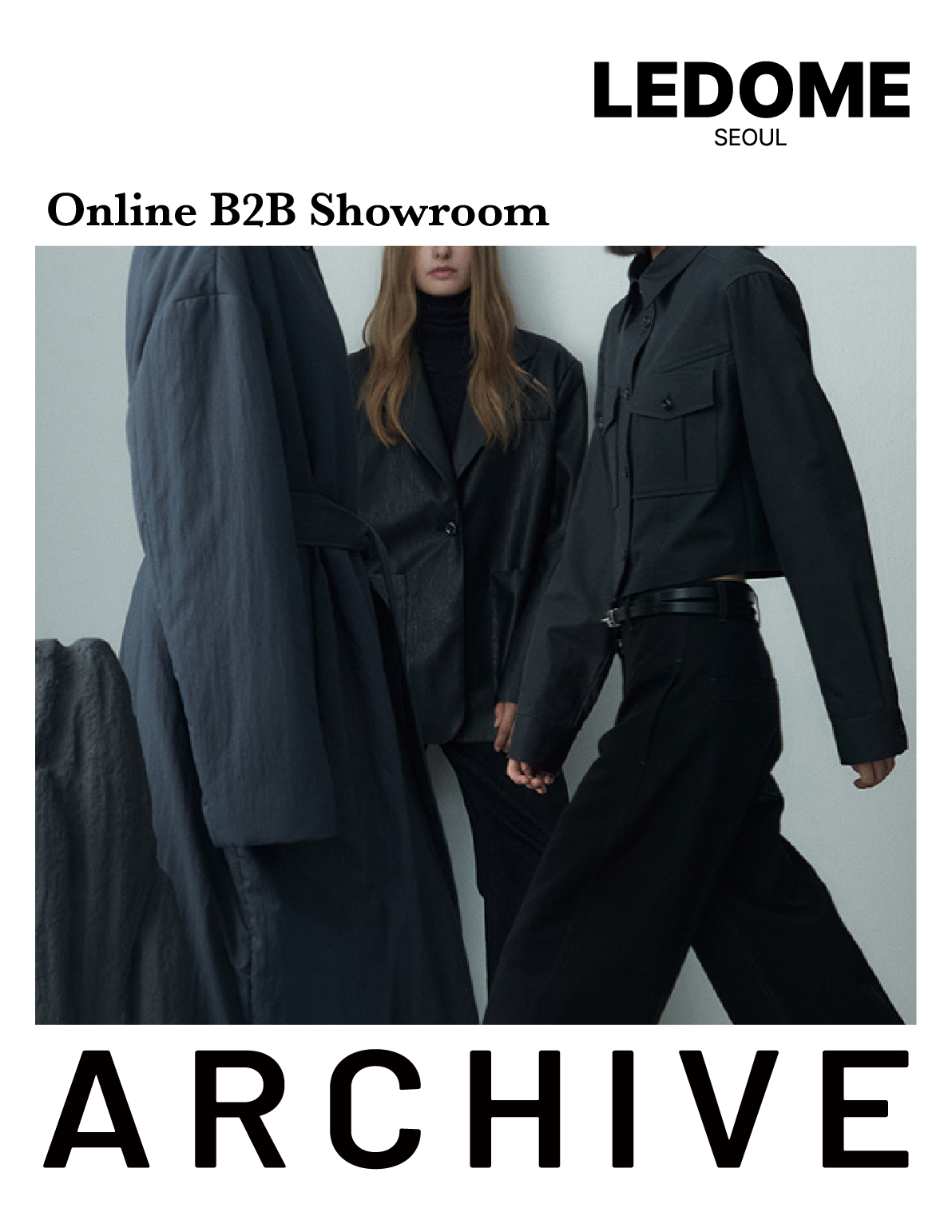| 리뷰 | 2015-02-26 |
[리뷰] 2015 가을/겨울 런던 컬렉션 트렌드 키워드 8가지
이번 시즌 70년대 트렌드는 마치 다리가 달린 듯하다. 2015 가을/겨울 뉴욕 패션 위크에서 강세를 보였던 70년대발 유행 경보는 런던 패션 위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70년대에 대한 오마주를 연상케 한 2015 가을/겨울 런던 컬렉션의 트렌드 키워드 8가지를 소개한다.

늘 창조적인 발상과 아이디어로 세계 패션계를 설레게 만드는 예술적 자유주의자 런던 패션 위크의 회오리 바람은 이번 시즌 역시 여전히 강세였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레트로 패션 정신으로 점철되었던 5일간의 이번 시즌 런던 패션 위크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를 살펴본다.
우리는 70년대가 뉴욕에 이어 런던에서도 반복되는 동안 이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정도로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아마 밀라노와 파리 역시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본다. 디자이너들이 모여 트렌드 정상 회담을 한 것도 아닌데 참 미묘하다.
고장 난 음반처럼 같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사람의 주사처럼 들리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70년대는 뉴욕에 이어 런던에서도 여전히 많은 패션쇼에서 나타났다. 탑샵 유니크, 버버리 프로섬, 매튜 윌리암슨은 런던에서의 트렌드 공범자(?) 중 일부에 불과하다. 다행히 몇 가지 새로운 트렌드가 선보여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
70년대 모드 스퀴드
사실 말하기가 약간 지겨울 정도로 70년대는 누가 뭐래도 이번 시즌 대세다. 지난 시즌 루이 비통과 샤넬과 같은 파리 발 70년대가 나왔을 때 메이저 트렌드로는 다소 의외였다. 패션 르네상스 60년대와 에코 패션의 80년대 사이에 낀 소수를 위한 보헤미안의 시대가 70년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상을 뒤 업고 이번 시즌 70년대가 급부상했다. 이제 70년대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최대 효과가 거두고 있다. 그러나 런던 역시 뉴욕처럼 70년대에 고개를 끄덕이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다. 올 시즌에는 70년대 모드 스퀴드(Mod Squad)가 갑이다.

<사진 왼쪽부터 피터 필라토, 마리 카트란주, 데이비드 코마, 닥스, 조나단 선더스>
프린지 효과
이번 시즌 디자이너들은 70년대 패션의 핵인 프린지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다. 뉴욕에 이어 런던에 까지 그 못 말리는 사랑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모든 디자이너들이 프린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극단적으로 사용했다. 21세기형 레트로의 최고 미덕은 리사이클 너머에 있는 창조적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 받는다. 바로 “프린지 효과”다.

<사진 왼쪽부터 파반느, 티무르 김, 줄리안 맥도날드, 버버리 프로섬, 잇사>
플레어처럼 날아 나비처럼 나빌레라
런던에서도 지속된 70년대 바람은 플레어 스타일로 흘러 넘쳤다. 어쩌면 스키니 팬츠를 떠나 보낼 출구 전략으로는 지금이 최고의 타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사실 스키니가 지겹지만 워낙 견고한 그 아성에 감히 플레어가 도전장을 내밀다니 역시 유행은 돌고 돈다. 어느 쪽이든 트라우저는 시즌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치마 바지인 퀼로트까지 가세했으니 게임은 끝났다. 스키니가 지겨운 일부 패셔니스타들에게는 이번 시즌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한다.

<사진 왼쪽부터 탑샵 유니크, 펠더 펠더, 유돈 최, 가레스 퓨, 조나단 선더스>
핑크적 상상은 현실이 된다
뉴욕에서부터 계속되어 런던으로 이어진 다양한 명암의 핑크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파스텔의 강세로 인한 스핀 오프 트랜드의 대표작인 셈이다. 이미 60년대애 오드리 햅번 주연의 영화 <퍼니 페이스>에서 당시 유행의 첨단을 달리는 패션지 에디터들은 핑크 원단을 몸에 두르며 새로운 패션으로 핑크를 노래했다. 그 영화적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이번 시즌 핑크는 다른 유명 컬러와 최고의 코트리스트를 증명해 보였다. 이제 핑크는 바비의 전유물이 아니다.

<사진 왼쪽부터 에밀리아 윅스테드, 마리 카트란주, 피오도르 골란, 토가, 시블링>
진한 보라색(Eggplant)
보통 보라색의 의미는 우아함, 화려함, 풍부함, 고독을 나타낸다. 그래서 도도한 여성을 위한 성깔 있는 색깔로 구분된다. 그 보라색이 이번 시즌 가지 때문에 더 진해졌다. 깊이 있는 가을이 준 자연의 선물 가지는 바바라 카사오라, 장 피에르 브라간자를 포함한 런던의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어 진한 보라색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 특히 자스퍼 콘란의 패션쇼에서 선보인 나뭇잎 안감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다. 이번 런던 패션 위크에서 선보인 최고의 터치가 아닐까 한다.

<사진 왼쪽부터 비엘마 런던, 자스퍼 콘란, 장 피에르 브라간자, 바바라 카사소라, 런던 컬리지 오브 패션>
믹스 & 크래시(Mix 'n Clash)
이번 런던 패션 위크에서는 프린트와 컬러, 텍스추어가 지금까지 아주 친한 죽마고우처럼 어깨동무로 함께 와서 일부 가장 흥미로운 룩으로 서로 충돌했다. 바로 믹스 & 크래사(Mix’n Clash)다. 어쨌든 극단적인 컬러 코디네이트의 깔 맞춤(Matchy-matchy)은 과대평가되었다. 믹스&매치에 이어서 나온 믹스&크래시의 탄생에 박수를 보낸다. 이제 남은 것은 소비자들의 코디네이트 감각이 아닐까 한다

<사진 왼쪽부터 주디 우, 센트럴 세인트 마틴스, 두로 올로우, 민난 훠이, J.W 앤더슨>
몽골리안 퍼
이번 시즌에는 윤리적 패션을 외치는 지속가능패션을 비웃기라고 하듯 천연 모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아우터 코트는 물론 칼라와 소매와 같은 부분적인 디테일까지 그야말로 털털(?)거리는 가을 시즌이 예상된다. 한편 여우 털이 이번 시즌 뉴욕 패션 위크가 선택한 모피였다면 런던은 푹신한 측면의 그 무엇인가에 집중했다. 바로 몽골리안 퍼로 뉴욕과 다른 한방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홀리 펄튼, 애쉴리 이샴, 사스&바이드, 매튜 윌리암슨, 하우스 오브 홀랜드>
케이프 십자군
70년대 교과서 같은 패션쇼를 선보인 버버리 프로섬 패션 쇼장에 나타난 케이트 모스는 그 어느 때 보다 매력적인 프린지 케이프 룩을 걸쳤다. 쇼 장 관객들은 케이트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할 지 모르지만 버버리 프로섬 패션쇼에서도 몇 가지 케이프가 런웨이를 질주했다. 언제부터인가 케이프는 버버리를 위한 크리스토퍼 베일리의 신의 한 수였다. 만약 밖으로 나가 이 트렌드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지목한다면 그것을 바로 케이트 모스일 것이다.

<사진 왼쪽부터 두로 올로우, 마리오스 슈밥, 버버리 프로섬, 자일스, 멀버리>
월페이퍼 프린트
종종 세월이 차례로 쌓여 보풀이 생기면 이러한 프린트는 어떤 룩을 위해 컬러와 복잡함을 추가한다. 이 트랜드의 감투상을 꼽으라면 그것은 같은 카데고리의 일부인 실내 장식 용 프린트가 아닐까 한다. 사실 월페이퍼 프린트(Wallpaper Prints)가 의미하는 무늬의 특징은 명확하지 않지만, 20세기 초까지 유럽에서의 전통적인 벽지 무늬를 가리킨다. 로코코 풍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꽃과 잎의 무늬나 인도 풍의 기하학적인 구성의 정교하고 치밀한 무늬, 사라사 무늬, 작은 꽃 등 세로줄 무늬와 사랑스러운 장미꽃의 연속무늬를 서로 교차시켜 배치한 프린트는 복고 그 이상의 헤리티지적 접근이 아닐까 한다.

<사진 왼쪽부터 사이먼 로샤, 에르뎀, 마리 카트란주, 버버리 프로섬, 머더 오브 펄>
<자료참조=Fashionista>
패션엔 유재부 기자
kjerry386@naver.com
- <저작권자(c) 패션엔미디어, www.fashionn.co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